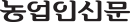“유기농업은 모든 농업인들이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의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대안으로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이 자연스럽게 주목 받으며 실천에 나서는 농업인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관행농법에 길들여진 농업인들은 유기농업의 귀찮음에 이내 관행농업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현실에서 평생 유기농업을 실천하며 이웃 농가에 아낌없이 노하우를 전수하며‘함께’라는 구호를 외치는 주인공이 있으니 그가 바로 송효수 한국농촌지도자고흥군연합회장이다. 현재 7만여평의 쌀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중 유기인증 쌀 재배면적은 3만 6천평에 달한다.

■ 실패 거듭하다 유기농법 완성
고흥군 두원면이 고향인 송 회장은 20대 초반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 희망이 없어 보였던 농촌에서 사느니 도시가 괜찮겠다는 생각에서다. 직장생활을 하던 그에게 뜻하지 않는 제안이 왔다. 모 기업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두원면 일대 농지 관리를 부탁받은 것이다. 당시 송 회장은 2~3년만 관리해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가족들을 설득해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
막상 내려와서 보니 삶이 지루했다. 오늘은 친구들과 내일은 지인들과 매일같이 노는데 바빴다. 그렇게 7~8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다 관리해 주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 10억원으로 3만평의 농지를 구매했다. 이때부터 송 회장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농사를 제대로 지어야 겠다는 생각에 한눈팔지 않고 밤낮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화햑 농약만 치고 나면 비염 증상이 심해져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 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화학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유기농업을 접하게 되었죠.”
그러나 유기농업은 생각처럼 녹록치 않았다. 내리 수년간 농사를 망쳤다.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전에 화학농약에 의존하던 관행농법에 익숙해진 탓에 적기 방제를 놓친 탓도 컸다. 수확량도 형편없이 떨어져 소득이 없다시피 했다.
‘그럼 그렇지’라는 주변의 시선도 따가웠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화학농약에 찌든 쌀을 더 이상 생산하고 싶지 않을뿐더러 언제가는 유기농 쌀이 대접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송 회장은 유기농업을 완성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발품 팔아가며 배움을 실천한 덕분에 희망이 보였다. 어느덧 자신만의 유기농업 재배법을 확립하게 되면서 그의 유기농업은 ‘승승장구’를 거듭했다.
■ 유기농업 성패 ‘적기 방제’ 가 중요
송 회장이 전국의 유기농업 단지를 찾아다니며 깨달은 것은‘토양관리’의 중요성이다. 화학농약과 비료 오남용으로 황폐해진 토양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유기농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땅심을 높이기 위해 볏짚을 토양에 환원하는 것은 기본이며 친환경 유박, 유기질 비료를 아낌없이 공급하고 있다. 화학제품에 비해 비용은 비싸지만 조수익으로 따지고 보면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송 회장은 벼농사에 침투하는 각종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화학농약을 대체하기 위해 황토, 유황, 오일, 현미식초 등을 혼합해 발효시킨 미생물을 3회 이상 살포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 쌀농사를 고집하면서도 관행농법과 비교해 수확량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미질과 향에서는 압도적인 차이가 발생한다고.
무엇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살포하기 때문에 유기농업을 실천하면서도 단 한번도 병충해 피해로 고민해 본적이 없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벼멸구 피해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유기농업을 실천하면서도 맛좋고 품질좋은 쌀을 생산하고 있다고 소문이 돌면서 송 회장의 행보를 지켜보던 인근 20여 농가가 유기농업 참여를 희망했다.
송 회장은 환영하며 직접 발효한 미생물을 참여 농가에 무상으로 살포해주는 수고스러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유기농업 실천농가가 늘어나면서 미생물 살포를 위해 5톤 트럭과 고압살포기까지 갖추는데 비용이 상당했지만 송 회장은 전혀 아깝지 않았다.
■ 유기농업 실천 당연한 것
송 회장은 유기농업이 한참 주목 받으며 유명세가 대단했지만 고령화에 접어든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하면서 안타까움이 앞선다. 더욱이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쌀을 두고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두고두고 아쉽단다.
이 때문인지 유기인증 쌀은 마땅한 판로가 없어 애를 먹고 있지만 한번 맛본 소비자들은 20~30년이 지나도 유기인증 쌀을 찾고 있는 것에 위안을 삼고 있다. 송 회장은 유기인증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놨으니 이것을 꽃 피우는 것은 후대의 몫이라 여기고 있다.
“유기농업은 결코 어렵지 않으며 모든 농업인들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분히 실천 가능합니다. 유기농업은 일부 농업인들이 누리는 특권이 아닌 모든 농업인이 당연히 추구해야하는 실천과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